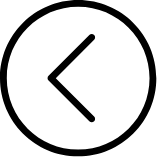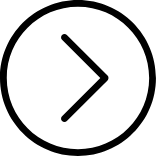"이게 얼마만이야? 근데 너 휠체어 타네? 예전엔 안 타지 않았어?"
누군가 나를 알아본 듯한 목소리에 역 직원이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있던 중 고개를 돌려 나에게 아는 척을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보았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들었던 생각은 하나였다.
“왜 너를 지금 여기서, 하필이면 내 몸이 좋지 않을 때 만날 건 뭐냐.”
내 기억 속에 그는 학창시절 동창이 아닌 학교폭력 가해자였다. 그는 당시에 내 짝이었고, 누구보다 나와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 비장애인이라는 신체적 방어력에 우위를 바탕으로 나를 괴롭히던 녀석이었다.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지금도 기억나는 행동은 자기의 쓰레기를 몰래 내 책상 속에 수시로 넣는 것이었다. 어느 날은 과자봉지이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그 시절 또래들이 항상 즐겨먹던 생라면 부스러기였다. 마음 같아서는 “네가 먹은 건 네 책상에 넣어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는 주먹질이나 멱살잡이 등 또 다른 폭력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반항할 수도 없었다.
거칠 것이 없었던 그는 청소 시간마다 “야 네 책상엔 왜 그렇게 쓰레기가 많냐?”는 말을 반복했고, 나는 순식간에 “지저분한 장애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학교에 교육청 담당자 방문 등으로 집중 청소가 필요할 때마다 내 책상은 “요주의 책상”으로 아이들에 의해 선생들에게 전달됨으로써 2차, 3차 피해를 낳았었다.
그놈은 그렇게 나를 괴롭히다 졸업할 무렵 “미안하다. 내가 철이 없었다"”며 사과했지만 그때의 기억까지 사라진 건 아니었다. 유행가 가사처럼 슬픔은 잊을 수가 있지만 상처는 지울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와 나는 졸업을 했고 그 기억들을 애써 지우고 살았었다.
그렇게 잊고 살던 도중 그 친구와 마주치게 되었고, 사람들로 복적이는 곳에서 과거 일을 굳이 꺼내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장애인 콜택시를 타지 않았던 것을 처음으로 후회했던 날이기도 했다. 그날따라 유난히 좋지 못했던 내 몸 상태도 그리고 연착이 되었던 지하철도 원망스럽기만 했다.
나만 힘든 것이었다. 그는 그 기억을 잊은 듯한 얼굴이었고, 그때의 기억을 오롯이 안고 당시에 받은 마음에 상처를 어느 정도 안고 살고 있는 사람은 나였다. 그 과정 속에 누군가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조금 덜 힘들었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기 마련이니 말이다. “내 편”이라는 그 한사람의 존재 유무에 따라 피해자는 자살을 생각하기도, 혹은 극단적 선택에서 돌이키기도 한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어진 “모범택시”와 “더 글로리”의 열풍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진다. 가해자를 제대로 응징하지 못하는 사법 제도와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이 아직 미흡한 우리나라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래서 올해 장애인의 날엔 이런 특집방송을 기대한다. ‘장애를 극복한’ 우리가 몇십년 간 보던 똑같은 방식의 그런 프로그램은 말고, 학교 폭력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장애인을 보고 싶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